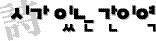유리창 한 장의 햇살- 최석균
- 기사입력 : 2013-12-26 11:00:00
-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선명할 때가 있다. 유리창 한 장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앉았다. 그 몸에 발을 담가본다. 그 마음에 손을 적셔본다. 따뜻하다. 오래 보고 있으니 조금씩 기운다. 천천히 옮겨간다. 지금껏 네 주변으로 다가간 몸의 열기 마음의 빛, 그렇게 살아있다. 네모거나 둥글거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너 아닌 존재의 그늘에 문득 떠오른 심장 하나, 손수건같이 간다. 칼같이 간다.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도요문학무크 4호(2013년)
☞ 바쁜 일상 잠시 멈추고 혼자 집에 있으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그림과 사진 속 풍경들, 그 위로 비치는 햇살과 먼지…. 이 시에서도 시인은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마주한 ‘유리창 한 장의 햇살’은 마치 체온이 있는 인격체인 양 시인에게 다가오네요. 시인은 그 마름모꼴 햇살에 ‘발을 담가’보기도 하고, 햇살의 ‘마음에 손을 적셔’보기도 합니다. 따뜻함이 전신으로 번지나 봅니다.
그렇게 ‘오래’ 있던 시인은 거실 바닥의 햇살이 ‘천천히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급함 없이 가식 없이 ‘천천히 옮겨’가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 ‘조금씩 기우는’ 시인의 마음도 ‘햇살’의 마음과 비슷함을 느낍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번 마음을 주고나면 설사 자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몸의 열기 마음의 빛’이 주변에 ‘그렇게 살아’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너 아닌 존재의 그늘에 문득 떠오른 심장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햇살 같은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일까요. 하지만 햇살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천천히 옮겨가는’ 동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니까요.
‘유리창 한 장의 햇살’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런 햇살 같은 사람인가요? 추운 날씨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나 마음 따뜻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