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탐독(日常耽讀) (1) 박완서/ 그 남자네 집
- 기사입력 : 2015-03-04 14:37:56
- Tweet
<시작하면서 : 책을 읽다 무릎을 치며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건 필경 책의 어느 한 부분이 당신의 아프고, 불안하고, 여리디 여린 마음을 꿰뚫어 표현했기 때문이리라.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문장과 그것이 안겨주는 순간의 통찰. 불현듯 찾아왔다 떠나가버리는 일상의 사소한 깨달음들을 아름다운 문학작품과 함께 기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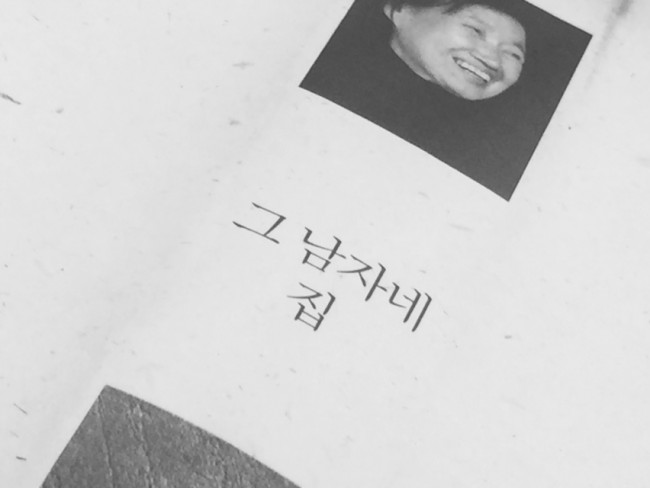
나는 그 남자네 집을 안다. 차를 몰아 회사와 집을 오갈 때, 어김없이 그 남자네 집 앞을 지나게 된다. 금낭화나 수국이 피는 정원이 있거나 선명한 색의 지붕이 아름다운, 그런 낭만적인 집은 아니다. 흔하디 흔한 대단지 아파트, 수백 개의 똑같이 생긴 네모난 공간 중 하나에 그가 산다. 아니, 그의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산다.
'그가 멋있어 보일수록 나도 예뻐지고 싶었다. 나는 내 몸에 물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구슬 같다고 했다. 구슬 같은 눈동자, 구슬 같은 눈물, 구슬 같은 이슬, 구슬 같은 물결… 어디다 그걸 붙여도 그 말은 빛났다. 그 해 겨울은 내 생애의 구슬 같은 겨울이었다.'- 세계사/박완서 소설전집 22권 '그 남자네 집'/42페이지
나는 스물 넷에 그를 알아 스물 여섯에 헤어졌다. 그때의 내 모습이 박힌 사진들을 들여다 본다.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반질반질 윤이 나고, 또 얼마간은 불안정해 보인다. 박완서 선생의 소설 속 '그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구슬 같다"는 찬사를 보낸다. 장미도 아니고 앵두도 아니고 구슬이라니. 적어도 그를 만날 땐 그에게 나도 구슬 같은 처녀였나. 그럼 그는 내가 가장 단단하고 영롱한 구슬이던 시절 나를 가졌던 유일한 남자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무심한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몸 안쪽 어딘가가 좀 쓰리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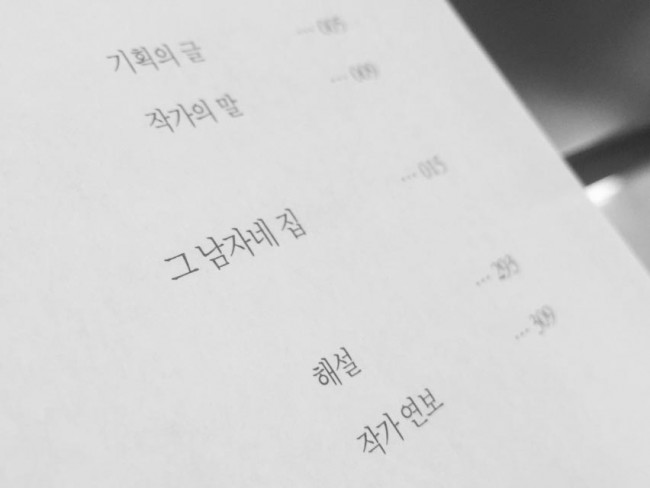
'그 남자가 부산 간 날이면 나는 외롭고 쓸쓸해서 이불 속에서 몰래 숨을 죽여 흐느끼곤 했다. 아무리 시장바닥에 인간들이 악머구리 끓듯 하면 뭐하나. 그가 없는 서울은 빈 거나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남은 남녀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하루만 더 그 무의미, 그 공허감을 견디라 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루하루 절박하고도 열정적으로 그 남자를 기다렸다.' - 세계사/박완서 소설전집 22권 '그 남자네 집'/47페이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가 양미간을 찡그리며 담배를 피우던 스산한 옆 얼굴을. 소주 몇 잔에도 쉽게 붉어지던 두 뺨을. 그가 가진 소심함과 두려움과 아픔들을. 심통이 난 연인을 웃게하려고 급조한 썰렁한 농담들을. 그를 잃고 내가 흘린 눈물들을. 그리고 차마 여기엔 쓸 수 없고, 쓰여져서도 안될 많은 것들을. 유치하게 '위대한 개츠피'를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 남자네 집 앞 도로를 지나며 문득 고개를 들어본다. 어쩌면 내 입맛에 맞는 새하얀 벽지로 도배를 하고 아기자기한 세간을 들여놓고, 그 남자와 함께 새끼 까고 알콩달콩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그 남자네 집을.
'청첩장을 내보였다. 내용을 확인하더니 조금 돌아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흐느꼈다. 나는 그의 어깨가 요동치는 걸 보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를 보듬어 내 품안에 무너져내리게 하고 싶었다. 그때 그가 바란 건 어머니의 품속 같은 위안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었다. 내가 감추고 있는 건 지옥 불 같은 열정이었다. 그렇게 오래 붙어 다녔지만 그 남자하고 나는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그 남자와의 어떤 몸의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비로소 나도 돌아앉아 눈물을 보였다. 답례처럼, 절차처럼.… 나의 눈물엔 거짓은 없었다. 이별은 슬픈 것이니까. 그러나 졸업식 날 아무리 서럽게 우는 아이도 학교에 그냥 남아 있고 싶어 우는 건 아니다.'- 세계사/박완서 소설전집 22권 '그 남자네 집'/95페이지
그와 나는 이어지지 못했다. 아니,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은 걸까. 어쨌건 우리는 남남이 됐다. 내게 그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그는 그의 아내와 아이 이야기를 했고 나는 들었다. 생각보다 덤덤했고 담백했고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다. 그때 알았다. 나는 더이상 구슬 같은 처녀가 아니고, 그도 더 이상 내가 갈망했던 그 남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 남자네 집'엔 '그 남자'가 살고 있지 않다. 다만 내가 이따금 어떤 간절함이 배어 있는 눈으로 그곳을 올려다 보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한때 그와 내가 나눠가졌던 애끓는 순수, 그것에 대한 깊은 애도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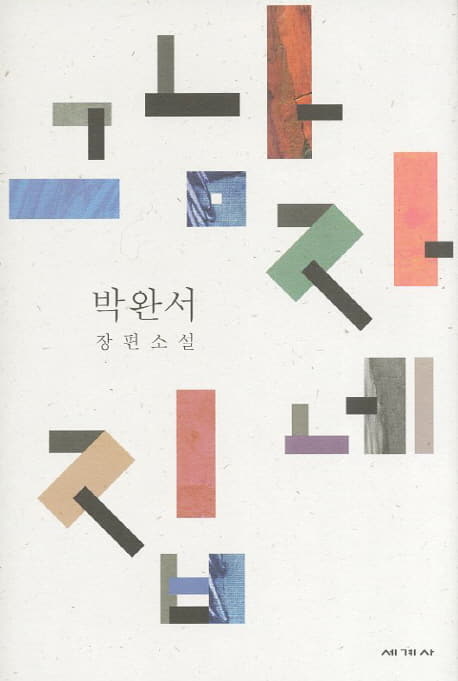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