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 일상탐독 (12) 이성복/어떤 싸움의 記錄
- 기사입력 : 2015-11-19 14:12:02
- Tweet
나는 이미 독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였다.나는 어떤 결심 속에 있었다.
누가 그날 내 얼굴을 봤다면, 뱀의 눈처럼 차가운 눈동자 속에 단단하게 또아리를 튼 붉은 불빛을 보았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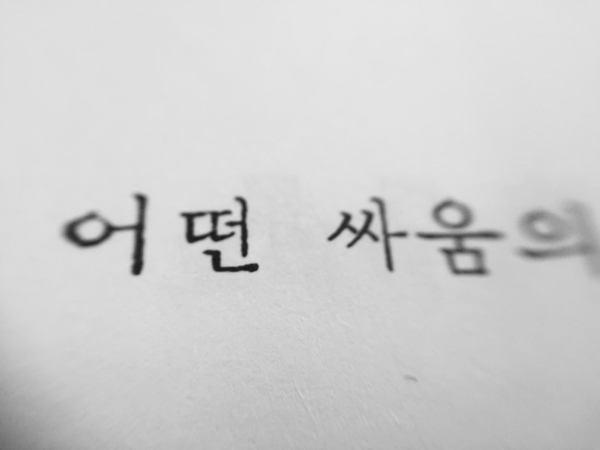
차례를 지낸 뒤 친지들 모두가 둥글게 둘러앉아 막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왁자한 분위기였고 모두가 화기애애한 대기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나도 숟가락을 들었고, 뜨거운 탕국을 한 숟갈 떠 입으로 가져갔다.
젓가락을 뻗어 민어와 도미의 흰 살점도 뜯어 먹었다. 생선의 살은 짜면서도 달았다.
그러나 나는 먹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공격할 틈, 그 좁고 날카로운, 섬광같은 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의 싸움은, 그것을 싸움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리하여 오늘은 꼭 말하리라. 꼭 당신들의 잘잘못을 내 입으로 심판하리라.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나는 지난 30여년을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다. 단언컨대 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날 그렇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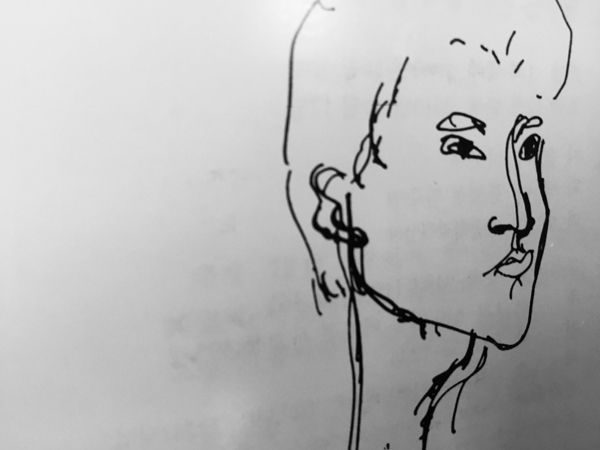
식사가 거의 마무리 됐을 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할말이 있어요.'
친지 몇은 여전히 음식을 먹고 있었고, 몇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정말 경우가 없으시네요.'
내 두번째 발언에 친지들 대부분이 일제히 젓가락질을 멈췄다.
나는 말했다. 오래 준비했던 말. 몇번을 가다듬고 정제해 함축하고 비축했던 말.
'온다간다 말 한마디 없고 고생한다 말 한마디가 없네요. 우리가 언제 도와 달라 했나요, 제수비용을 보태달라 했나요?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셔야지요. 연락이라도 제때 해야 사람이 걱정을 덜하고 하염없이 기다리지나 않지요. 왜 그러실까요. 배울만큼 배우신 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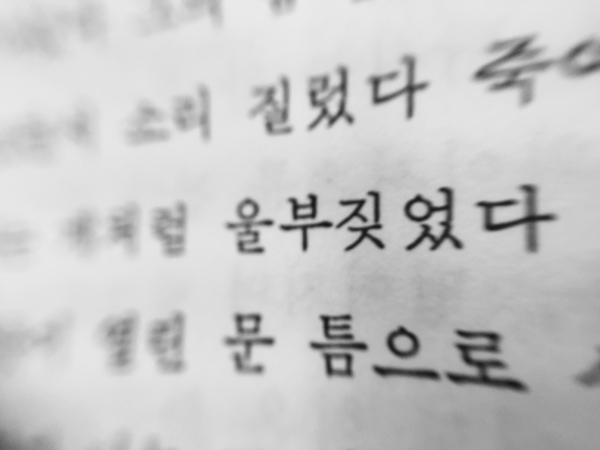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버렸다. 입속에 자갈이라도 한 주먹씩?문 것처럼, 시커멓게 굳었다.
그렇게 몇 분이 몇 년처럼 흘러갔다. 어느 누구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쿵쾅대는 맥박이 금방이라도 살갗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판을 깬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앙다물더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의 플레어 스커트 자락이 현관 안에 긴 그림자를 남겼다. 곧 거친 문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둔탁하게 울려퍼졌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숟가락에 묻어있던 쌀알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가 내 눈을 노려보며 말했다.
'감히 니가,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냐. 니가 내 상전이라도 되는거냐. 서울에서 여기를 왔다갔다 하는 게 그리 쉬워보이냐.'
그는 몹시 당황했고, 그러므로 격앙돼 있었다.
나는 두번째 기습을 노렸다. 내 입술은 노회한 노인의 그것처럼, 아주 천천히 열렸다.
'됐고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나 꼬박 꼬박 잘 하세요. 똑바로 하시라고요.'
말을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서랍장에 놓여있던 차키를 잡아채듯 집어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걸어나갔다. 나는 그날 밤 늦도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눈부시던 가을날, 친지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뒷수습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묻지 않았다. 알고싶지 않았고, 굳이 알아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나 카레리나' 첫 구절은 이렇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보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다.
다복하고 화목한 대화와 웃음, 다정한 제스쳐.
그러나 그 안에 깃든 허구를 나는 본다.
결혼과 출산, 육아, 집안 대소사, 권리와 의무의 혼재,?무한반복되는 적나라한 일상. 그 속에 깃든 갈등. 닳고 닳은 관계. 부서져내리는 자아(自我). 사실은 모두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사는 그것.그것에 대해 한번은 시비를 걸고 따지고 싶었다. 가슴 아프게, 그러나 통쾌하게.

이 글은 2년 전 추석, 내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저지르고 만 어떤 싸움에 관한 기록이다.
그날의 경험을 이성복 시인의 시에 빗대어 적어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개새끼 건방진 자식 하며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샤쓰를 찢어발기고 아버지는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또 눈알을 부라리며 이 씨발놈아 비겁한 놈아 하며
아버지의 팔을 꺾었고 아버지는 겨우 그의 모가지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신발 신은 채
마루로 다시 기어 올라 술병을 치켜들고 아버지를 내리
찍으려 할 때 어머니와 큰누나와 작은누나의 비명,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땀 냄새와 술 냄새를 맡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리 질렀다 죽여 버릴 테야
法도 모르는 놈 나는 개처럼 울부짖었다 죽여 버릴 테야
별은 안 보이고 갸웃이 열린 문 틈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라일락꽃처럼 반짝였다 나는 또 한번 소리 질렀다
이 동네는 法도 없는 동네냐 法도 없어 法도 그러나
나의 팔은 罪 짓기 싫어 가볍게 떨었다 근처 市場에서
바람이 비린내를 몰아왔다 門 열어 두어라 되돌아올
때까지 톡, 톡 물 듣는 소리를 지우며 아버지는 말했다'
'어떤 싸움의 記錄'- 문학과지성사/이성복/'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55페이지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