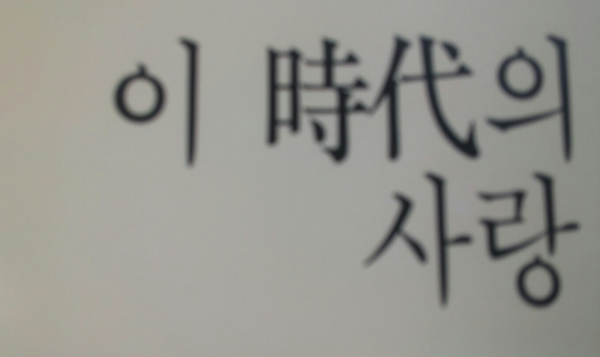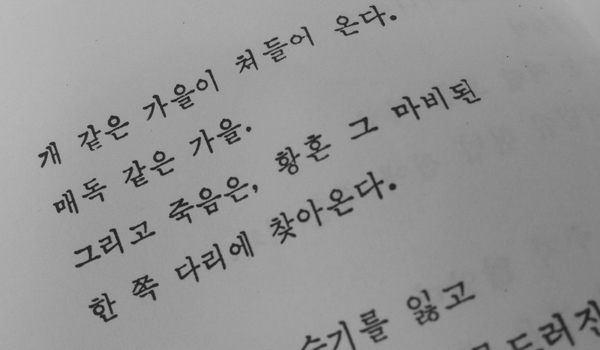[살롱] 일상탐독 (19) 최승자/개 같은 가을이
- 기사입력 : 2016-09-21 10:47:07
-
-
바야흐로 가을이군요.
추석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끝자락에 아울렛 매장에 들러 트렌치코트를 한 벌 샀습니다.
깃이 넓고 소매통이 좁은 롱코트인데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들고 밤거리를 타박타박 걸어 집으로 오는 기분이, 참으로 참담했달까요.
어둔 거리에 한참을 서서 구두굽에 바싹 마른 나뭇잎이 가루처럼 바스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쇼핑의 기쁨도 무력하게 만드는, 가을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이번 가을은 미친듯한 흔들림, 공포, 무력감과 함께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시장 근처 5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어요.
네다섯 평 남짓한 공간 안에 지인 서너 명과 함께 있었는데,
순간 선반 위에 놓여있던 TV가 좌우로 미친듯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덤프트럭 같은 것이 건물 인근 지반을 뭉개고 지나갔구나 했습니다.
그 정도의 흔들림은 우리 전부 감수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뭔가 상당한 것이 우리가 속한 시공간을 요란하게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알아차렸달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어긋나게 교차했고 몇몇은 허공에다가 손을 휘휘 젓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꽉 붙들어 잡아야할 손잡이 같은 것이 있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그 시각 친구 A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차된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흔들리며 귀가 찢어질 듯 사이렌을 울리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A는 그 순간을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인 B는 그 시각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반에 아슬아슬하게 놓아 둔 접시가 조금씩 자리를 옮겨 발아래로 훅하고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게 마치 발목을 자르는 날카로운 톱날 같이 느껴졌다나요.
그날의 흔들림은, 관측 사상 가장 센, 무자비하고 무례한 지진이었다더군요.
A와 B는 생(生)을 떠받치고 있던 지반이 흔들리던 그 몇 초가 무한 같고, 영원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날 느낀 많은 것들을 조합해 보면, 그건 지금껏 단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신세계'와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실상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
때문에 유의미한 그 무엇일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아, 미친듯이 흔들렸던 가을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간단하게 'K'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2008년, 저는 학부 4학년이었어요.
한 학기 휴학을 했던 탓에 코스모스 졸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달까요.
사범대를 나온 탓에 조화섭, 우성수 같은 당시 이름 날리던 스타강사들의 교육학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들을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하는 회의에 빠져드는 지리멸렬한 나날들이랄까요.
그 혼돈 속을 K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K는 저와 나이가 같은, 군대를 다녀와 막 복학한 경영학과 남학생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선배를 끼고 자연스레 알게 된 친구였어요.
K는 제가 홀로 기숙사와 도서관을 오가며 종종걸음 친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이상한 버릇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술을 한 잔 한 뒤 도서관 앞에 와서 저를 불러내 커피 한잔을 하고 가는 겁니다.
서로 딱히 할 이야기도 없었어요. 시답잖은 농담 몇마디 하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K는 당구장이나 PC방에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우린 몰랐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분간할 분별력이 저에게도 K에게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K와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졸업식에 꼭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K는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다 가도록 저는 늘 울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했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게 대체 무슨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일담이지만, K는 얼마 전 결혼을 했어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웨딩사진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K는 변함없는 얼굴로 신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래서 흔들렸냐고요? 약간은요.
하지만 제가 흔들린 건 지진 때문도 K의 결혼 소식 때문도 아닙니다.
저에게 가을은 그런 계절이니까요.
가을을 견뎌야만 멀쩡하게 겨울과 봄과 여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가을에 일어난 유독 아프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일이 기억해내어 말하자면 소리 내어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하게 주저앉힐 때,
무력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만큼 왔고,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 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그 황혼 그 마비된
한 쪽 다리에 찾아온다.
모든 사물이 습기를 잃고
모든 길들의 경계선이 문드러진다.
레코드에 담긴 옛 가수의 목소리가 시들고
여보세요 죽선이 아니니 죽선이지 죽선아
전화선이 허공에서 수신인을 잃고
한번 떠나간 애인들은 꿈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고 괴어 있는 기억의 廢水가
한없이 말 오줌 냄새를 풍기는 세월의 봉놋방에서
나는 부시시 죽었다 깨어난 목소리로 묻는다.
어디 만큼 왔나 어디까지 가야
강물은 바다가 될 수 있을까.'
'개 같은 가을이' - 문학과지성사/최승자/'이 時代의 사랑'14페이지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