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뒤에 숨은 것들- 최광임
- 기사입력 : 2019-07-18 08:00:24
- Twe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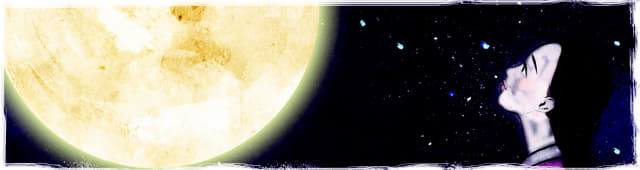
그러니까 너와의 만남에는 목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헤어짐에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래전 떠나온 이승의 유목민
오던 길 가던 길로 그냥 가면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너와 나 들꽃이 되는 것이다
달이 부푼 가을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
구절초밭 꽃잎들 제 스스로 삭이는 밤은 또 얼마나 깊은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서로 묻지 않으며
다만 그곳에 났으므로 그곳에 있을 뿐,
가벼운 짐은 먼 길을 간다
내가 한 계절 끝머리에 핀 꽃이라면
너 또한 그 모퉁이 핀 꽃이었거늘
그러므로 제목 없음은 다행한 일이다
사람만이 제목을 붙이고 제목을 쓰고, 죽음 직전까지
제목 안에서 필사적이다
꽃은 달이 기우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달은 꽃이 지는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 만약
인간의 제목들처럼 집요하였더라면 지금쯤
이 밤이 휘영청 서러운 까닭을 알겠는가
꽃대궁마다 꽃 피고 꽃 지고, 수런수런
밤을 건너는 지금
-시집 ‘도요새 요리’(2013, 북인) 중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유를 붙이고 목적을 찾는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그러니 나는 너와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더 넓은 식견을 익히기 위한 목적이야, 삶을 재충전하기 위한 거야’.
우리는 무얼 하나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와 목적들이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자꾸 무얼 끌어다 붙이려고 한다. 다만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사랑하거나 여행을 떠날 수는 없는 걸까. 아무런 제목을 붙이지 않고 그저 즐기면 안 되는 걸까. 이유와 목적과 제목과 이름 뒤에 갇혀 죽을 때까지 필사적이지 말고 왔던 길로 슬그머니 다시 되돌아가는 들꽃같이, 달이 부푼 가을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밤 구철초 꽃잎들 제 스스로 삭이며 깊어가는 밤처럼 그렇게 순리대로 가벼운 짐이 멀리 가듯이 살면 안 되나.
다만 그 자리에 났으므로 그곳에 있으니 지금쯤 이 밤이 휘영청 서러운 까닭도 묻지 말고 수런수런 건너가자. 내가 한 계절의 끝에 핀 꽃이니 너 또한 어느 한 모퉁이에 핀 꽃이니 헤어진다 서러울 것도 다시 만남을 기약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이기영 시인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