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경 기자의 문학읽기] 조은길, 입으로 쓴 서정시
잔인한 현실 속 절망, 서정의 변주로 빚어내다첫 시집 발간 후 12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시집
- 기사입력 : 2019-11-27 21:11:42
- Tweet
시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믿었다. 그것은 단단한 씨를 품은 열매와 같아서, 사계절을 지나며 과육이 영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믿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잘 익은 열매를 맛본 일은 손에 꼽는 일이다.
채 영글지도 않은 과일을 따는 시인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들은 등단한 지 얼마 안 되어 첫 시집을 내고, 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내고, 돌렸다. 탓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담당 기자로서, 고만고만한 속에서도 선연하게 존재를 드러내고야 마는 밀도 있는 시집을 바라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책을 드디어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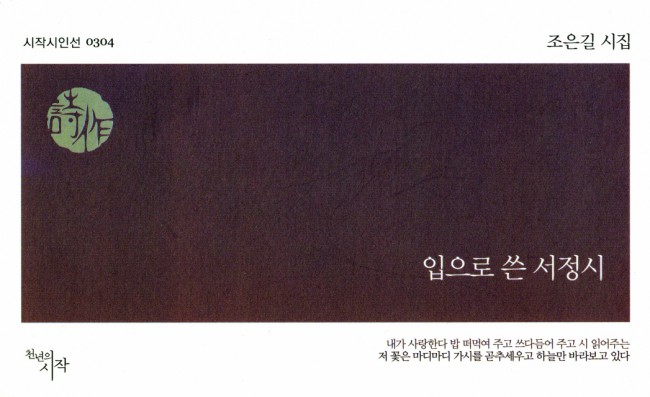
조은길 시인의 시집 〈입으로 쓴 서정시〉는 시인이 등단 이후 두 번째로 내놓은 시집이다. 첫 시집 〈노을이 흐르는 강〉도 등단 9년 만에 내놓더니, 다시 12년이 흘렀다. 잘 익어 떨어진 열매는 급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 음미할 필요가 있다. 흔하디 흔한 서정시라지만 조 시인의 시들이 품고 있는 서정의 변주는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다.
‘어머닌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처녀막을 뜯겼다는데 그것이/내 출생의 유일한 알리바이라는데/그럼 뭐 어때 어머닌/나를 죽자 사자 아껴주고/나는 나에게 소름 끼치도록/사랑이 샘솟는 걸//어디서 종소리가 들려온다//종지기 콰지모도는 아름다운 에스메랄다를/어쩌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은/얼마나 잔인한 축복인가//종소리가 뚝 끊겼다//괜찮아 괜찮아 너 없는 곳이 지옥인 걸/한번 더 안아줄까 내 사랑’ - (‘즐거운 나날들’ 일부)
시집을 관통하는 정서는 ‘절망’이다. 근원적으로 이 세상 무엇과도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자각. 이 자각 앞에서 시인은 절망한다. 심지어 스스로 먹이고 입히는 자신의 몸도 마음과 따로 노는 이 잔인한 현실. ‘입으로 쓴 서정시’라지만 ‘입이 아프니 밥도 못 먹겠고/밥을 못 먹으니 온몸이 죽을상이 되어/입을 올려다본다 하지만//입은 회로가 다른 전선처럼/아랑곳하지 않는다’(‘입으로 쓴 서정시’ 일부)고 담담하게 노래한다.
등단 20여년에 책 2권. 시인은 지나친 염결주의자일까. 이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묵직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어딘가에 짐처럼 쌓일 책을 만드는 일이 싫었다. 시라는 관념 앞에 엎어져 그것을 신봉하며 살기도 싫었다. 시를 무시하며 시를 썼다. 그러니 보기 좋게, 예쁘게 쓰지 않으려 했다.” 〈입으로 쓴 서정시〉는 지난 9월 천년의 시작에서 출간됐다. 조은길 시인은 199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