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의 詩- 임성구
- 기사입력 : 2010-12-09 00:00:00
- Tw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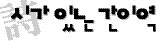

석류알 같은 한 줌 빛 와르르 쏟는 시월 오후
붉은 발자국 찍는 노란구두 한 켤레가
바스락
땅 위에 시를 쓴다
태곳적 붓을 들고
폭풍이 몰아치는 얼음의 강을 지나
벌나비 춤추던 알싸한 초원도 지나
매미가 목청을 돋우던 통증 멀리 사라진 언덕
은행나무가 줄지어 레일을 만드는 동안
불면의 밤은 또 얼마나 깊고 깊었던가
이 가을
낙엽을 굴리며
열차는 득음에 든다
-임성구, ‘낙엽의 詩’ 전문(‘경남문학’ 겨울호, 2010)
☞ 햇살 맑은 날, 은행잎들이 떨어집니다. 움틀 때부터 붙박인 몸으로 이리저리 바람이 흔들어도 할 말 다 못하고 푸르다 푸르다고만 고개 끄덕였지요. 나무를 떠나고 나서야 나뭇잎은 제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나 봅니다.
몸으로 구르며 말을 하고 싶고, 몸이 닳도록 땅바닥을 긁으며 쓰고 싶나 봅니다. 붉은 글씨로 노란 글씨로 온몸 붓 한 자루가 되어 시를 쓰게 되나 봅니다.
태곳적부터 시작된 나뭇잎의 생(生), 수많은 열차를 갈아타며 수많은 역을 지나 여기까지 다다랐겠지요.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던 매서운 겨울부터 봄여름을 지나면서 겪은 길디 긴 세월이 있었겠지요. 잠 못 이룬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레일 위에 실어서 엮어 봅니다. 또 그렇게 흐르고 흘러 가닿을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나무는 바스락거리며 써내려가는 낙엽의 시를 들으며 열차처럼 묵묵히 먼 길 떠납니다.
우리네 인생역정도 그와 같아서 바스락거리는 낙엽같이 몇 줄 시로 대신하며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시(詩)는 이렇게 멀고도 깊은 곳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곳에 존재하나 봅니다. -최석균(시인)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