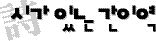출근- 김하경
- 기사입력 : 2014-02-06 11:00:00
-
나는 밥벌이를 간다
차창에 금방 씻고 나온 해가 뜬다 저 산봉우리와 봉우리가 새색시 젖무덤이다 능선에 걸친 해는 젖꼭지라 하자 둥글둥글한 젖가슴이 잘 차린 내 아침 밥상이다 배밀이 하듯 하루를 기어가는 어린 짐승 얼굴에 묻은 우유 빛 자국이 질펀히 묻었다 밤새 젖주림에 칭얼거렸던 어둠 젖어미 따스한 온기는 하늘을 감싸 안았다 일출은 매일 아침 참젖을 물린다
어린 짐승은 초유를 빨아 먹는다 오물오물 아랫배가 든든해지고 성장판이 열린다 뼈마디가 자라는 배냇니 하얀 핏속을 달린다 둥근 젖가슴에 모서리가 없듯 샛길을 가로지른 어린 짐승은 빠른 길을 달린다 어미의 대를 잇는 배꼽은 대물림이다 뚝뚝 떨어지는 시간 받아먹는 입술이 햇살 아래 환하다 젖살 퉁퉁 차오르는 어린 짐승은 전진기어를 넣는다
☞ 먼 거리 직장까지 바쁜 출근길에도 그녀는 차창 밖에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다. 산들아 안녕 지나가는 가로수들아 너도 안녕, 그녀가 전진기어를 넣을 때마다. 햇살 아래 만나는 길도 하늘도 오물오물 아랫배가 든든해지고 성장판이 열린다. 그녀 특유의 친절함에 세상의 아침이 여지없이 둥글어진다. 가끔씩 만나는 우리가 그녀의 차를 탈 때마다 멀미를 하는 이유 따위는 늘 쓸모없는 안부이다. 밥벌이를 가는 시인과 차창 밖의 사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는 동안 이미 한통속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차려진 감성의 밥상이자 함께 어린 짐승이 빨아먹는 초유와 같은 따뜻한 힘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 과속의 페달조차 온전히 시인에게는 새로운 시어를 안겨준다. 김혜연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