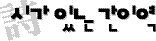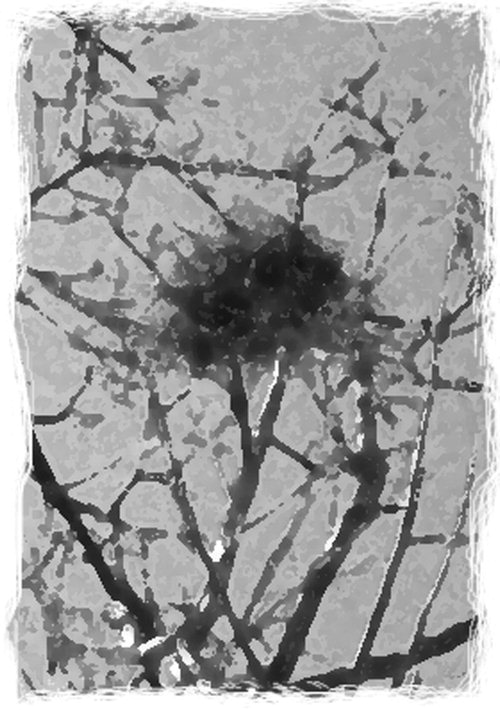새들의 페루- 신용목
- 기사입력 : 2012-01-05 01:00:00
-
새의 둥지에는 지붕이 없다
죽지에 부리를 묻고
폭우를 받아내는 고독, 젖었다 마르는 깃털의 고요가 날개를 키웠으리라 그리고
순간은 운명을 업고 온다
도심 복판,
느닷없이 솟구쳐오르는 검은 봉지를
꽉 물고 놓지 않는
바람의 위턱과 아래턱,
풍치의 자국으로 박힌
공중의 검은 과녁, 중심은 어디에나 열려 있다
둥지를 휘감아도는 회오리
고독이 뿔처럼 여물었으니
하늘을 향한 단 한 번의 일격을 노리는 것
새들이 급소를 찾아 빙빙 돈다
환한 공중의, 캄캄한 숨통을 보여다오! 바람의 어금니를 지나
그곳을 가격할 수 있다면
일생을 사지 잘린 뿔처럼
나아가는 데 바쳐도 좋아라,
그러니 죽음이여
운명을 방생하라
하늘에 등을 대고 잠드는 짐승, 고독은 하늘이 무덤이다, 느닷없는 검은 봉지가 공중에 묘혈을 파듯
그곳에 가기 위하여
새는 지붕을 이지 않는다
☞ 저도 늘 그것이 궁금했어요. ‘새의 둥지에는 지붕이 없’는데 어떻게 새들은 잠을 자고 이슬을 이겨내고 눈비를 그을까? 그러나 저는 그 궁금증을 곧바로 시나 산문으로 옮겨 쓰지는 못했어요. 하여간 먼저 쓰고 먼저 발표하는 사람이 임자지요. 시나 특허나 다 그런 것이랍니다.
‘죽지에 부리를 묻고/폭우를 받아내는 고독’을 여러분들도 아시는지요.
거창에서 김천으로 넘어가는 우두령, 그 아랫마을이 고향인 신용목 시인은 어릴 적부터 아주 세심하게 ‘바람의 어금니’를 보았던가 봅니다. 지붕을 이지 않는 새의 둥지와, 급소를 노리기 위해 공중을 빙빙 도는 새들을 보면서 자연과 사람을 혹은 자연과 세상의 이치를 포개 읽는 법을 자동으로 익혔나 봅니다.
이 추운 겨울, 하늘에 등을 대고 잠드는 짐승과 지붕 없는 새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유홍준(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