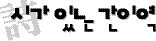아카시아 꽃- 최광임
- 기사입력 : 2014-05-15 11:00:00
-
빗방울이 아카시아 나무에 허기를 매달아 놓았어
비에 씻기운 달은 스무이틀의 내리막길을 걷고
잔득 뜸든 나무 제 몸을 솔솔 흔들어대고 있었어
바람은 초저녁부터 종적을 감추고 무뚝뚝한
어둠의 전신에 밥냄새 스며들었어
일제히 투명깃털이 되어 나는 새
나는 새를 만나기 위해 잠을 딛고 베란다로 나가
붉은 몸, 허기진 나무가 되어 기다렸어
숨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바람에게 전갈을 놓았어
어둠의 둔덕을 지나 마악 거실로 들어서는 새
호흡을 고르게 펴고 배를 부풀리다 그만
우우 내 몸에 만개한 흰 밥꽃
☞ 세상은 아카시아에게 점령당해버렸다. 아카시아는 지나가는 바람에도 우우우 웃어대며 정신을 홀려놓는다. 그사이 눈치채지 못하게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어느새 만개해버린 그녀의 흰 밥꽃. 잔뜩 뜸 든 나무는 뿌리 더욱 깊어가고 허기진 기억을 봉한 시인의 안부가 날아왔다. 처음 만났을 때가 이맘때쯤인가 베란다로 나가 숨소리를 죽이고 무뚝뚝한 어둠을 기다리자, 아무도 모르게 익숙한 향기가 코 끝 간질인다. 호흡 고르며 잠 깨우는 투명한 깃털 가진 아카시아 일제히 눈앞에서 날아오르는 새, 지금 마악 거실로 들어서는 봄 그 한가운데 서있는 절정 같은 시인, 스무이틀이고 기다리는 다시 생각해도 아까운 이 눈부신 계절. 김혜연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