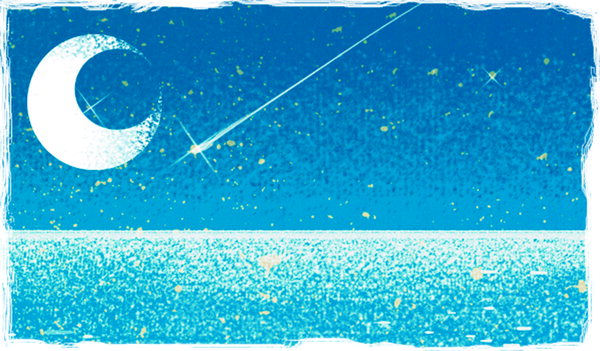내 여자는 동해 푸른 물과 산다
탁류와 해초들이 간간이 모여
이룩하는 근해의 평화를 꿈꾸지 않는다
저녁마다 아름다운 생식기를 씻어 몸에 담고
한층 어렵게 밝아오는 먼 수평선까지 헤엄쳐 나가
아침이면 내 여자는 새 바다를 낳는다
살을 덜어 나의 아들을 낳는다
내가 이 세상의 홀몸을 이기지 못해
천리 먼 길 절뚝여 찾아가면
철책 너머 투명한 슬픔의 알몸을 흐느끼며
문득 캄캄한 밤바다 되어 말 못하게 한다
다시는 여기 살러 오지 말라 한다
원경에서 바라보는 여자는 ‘내’ 여자다. 맑고 푸른 물에 살고, 탁류와 해초들이 이룩하는 근해의 평화 따위 꿈꾸지도 않는 여자. 저녁마다 아름다운 생식기를 씻고, 수평선까지 헤엄쳐 나가 새 바다를 낳는 여자. 이 여자는 ‘내가’ 낳은 여자다. 내 욕망과 소망이 투영된 환상일 뿐이다. 고래사냥 부르며 삼등열차 속에서 캔맥주 마시며 ‘꿈꾸는’ 고래일 뿐이다.
근경에서 만져 보는 여자. 철책 두르고 슬픔의 알몸을 흐느끼는 여자. 울음 우는 캄캄한 밤바다. 이 여자가 ‘그’ 여자다.
7행과 8행 사이에 ‘간격’을 두어 별 개의 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시인은 ‘간격’을 두지 않고 ‘내’ 여자와 ‘그’ 여자를 묶어 버렸다. 옳거니!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는‘‘내’ 여자와 ‘그’ 여자가 뒤섞인 여자인 것이다.
그렇다고, 자 들고 칼 들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냥’ ‘통째로’ 사랑하면 그만이다. 이중도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