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가 떴다- 이주언
- 기사입력 : 2010-11-25 00:00:00
- Tw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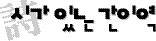

꽃 지고
잎 다 진, 겨울 도읍지에서
나무의 뼈들을 바라본다
골골 ― 보일러 돌지 않는 집처럼
얇은 햇살 귀퉁이에 어깨를 뉘고 걱정마라 내사 괘얀타마
삭정이 같은 두 발로 아랫목 더듬는 사람들
생을 지탱시킨 힘
제 살 다 내어준 뒤에야 드러난다
(중략)
오리무중의 늑골 사이를 유영해도
지상에 뼈들이 떴어도
야윈 뼈에 얹힌 둥지만 선명하게 보인다
미안해 엄마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햇살 드는 밥집에 앉아
젓가락 헤집으며 고등어자반 뜯어먹으며
뼈만 남은 자들의 슬픔
내 알 바 아니라 곱씹는다
-이주언, ‘뼈가 떴다’ 부분(‘경남문학’봄호, 2010)
☞ 겨울 도심, 조그만 햇살 드는 밥집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손과 발이 삭정이같이 말랐습니다. 그 손발을 주물러본 사람은 압니다. 손끝에 와 닿는 마디마디의 뼈, 곧 부러질 듯한 서늘한 감촉! 그 가슴에 손을 대본 사람은 압니다. 뜨겁게 돌아갔을 피와 바쁘던 근육이 다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는 집안을 지탱해 온 내력과 고생담을 반찬삼아 식사를 하시고, 시인은 창밖의 앙상한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성한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생산했을 나무가 지금은 찬바람 맞으며 보일러 돌지 않는 집처럼 지상에 떠있습니다. 지상에 뜬 뼈들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압니다. 가계를 지탱해온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고등어자반 뼈를 발라먹으며 눈물 훔치며 곱씹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인이 지탱해야할 생의 슬픔. 어느새 시인이 떠받치고 있는 새로운 둥지.
목욕탕 들러본 오랜 기억 하나 앙상한 나뭇가지를 타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등마저 내가 다 발라먹어 뼈만 남았을 아버지! -최석균(시인)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