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록서점 박희찬 대표가 현대문학 등 희귀 소장본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영록서점 박희찬 대표가 현대문학 등 희귀 소장본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씨가 소장하고 있는 1949년판 ‘과학공부 6-1’.
박씨가 소장하고 있는 1949년판 ‘과학공부 6-1’.
책은 독자들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된다. 그러나 삶의 좌표인 책도 산처럼 쌓이고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면 삶이 되고 종국엔 그 속에 갇히고 만다. 내가 곧 책이 되고 책이 곧 내가 되는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 사람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먹는지(?) 모른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역전시장 2층에 있는 책방 ‘영록(影綠)서점’ 박희찬(57) 대표는 그런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 사람이다.
산더미 같은 거대한 책의 공간, 그것도 새것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헐고 낡은 책, 최첨단 디지털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책에 ‘묻혀’ 살기 때문이다.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책 속에서 무아지경이 되어도 행복하다는 그가 망각하지 않는 게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헌책방 주인’이라는 자부심, 헌책의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적당한 시기(20년 후쯤)에 마치면 뜻있는 곳에 책을 기증,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기도록 하겠다는 야무진 꿈이 그것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역전시장 2층의 구석진 공간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그를 만났다. 다른 이 같으면 하루종일 일에 지칠 시간이지만 책 하나를 손에 든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고물상에서 수집해온 책”이라며 “이것이 1965년판 조지훈씨의 수필집 ‘지조론’인데 아느냐.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이다”고 털고 일어섰다.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묻자 “(귀한 책을 발견하니)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다”고 대꾸한다.
오래전부터 한 번씩 드나들던 책방이라 입구에 ‘도열’한 책이 눈에 익을 만도 했지만 아직도 낯선 얼굴이 휠씬 더 많다.
그만큼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는 책이 많고 또 새 손님을 기다리는 일도 잦다는 방증이었다.
어려웠던 시절, 헌책을 사고 팔며 ‘밥벌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책더미에 묻혀 사는 것이 행복한 헌책방 주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끼니를 잇게 해준 것도, 무거운 삶을 지고 사는 고단함을 잊게 해준 것도 바로 헌책이었으니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책이 있는 곳에서 그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을 수 있다.
가난했던 지난날은, 그에게 일찍 고단함을 알게 했다.
1968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등록금 1340원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돈벌이에 나섰다고 한다.
박 대표는 “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거무튀튀한 손으로 눈시울을 닦았다.
길거리에서 책 좌판을 보고 신기해서 책 장수를 따라다녔더니 수고비를 줘 3년간 모은 돈이 6000원이었다. 5000원으로 헌 리어카를 나서 헌책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첫날, 헌책 3권을 450원에 사서 180원을 벌었다. 생각보다 쏠쏠했고 고물상에서 책을 구입, 독자가 찾을 만한 책을 분류해 팔다가 바보의 대명사로 알려진 작고한 배삼룡 선생의 별호를 따 ‘바보서점’을 상호로 처음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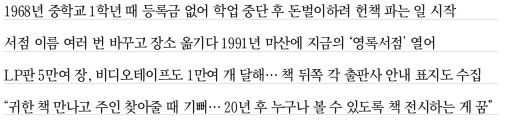
군 입대(39사단)로 바보서점을 처분하고 제대 후 ‘비실비실 서점’을 열어 재미를 봤다.
선비들이 숲처럼 많이 모여 글을 읽고 배우라는 의미에서 ‘유림(儒林) 서점’을 열고 결혼도 했지만 성격 차이로 곧 파경을 맞았다.
심기일전, 나이 31살에 5만원을 들고 부산을 떠나 마산(지금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팔룡교육단지)에 둥지를 텄다. 등하굣길 학생을 상대로 헌책을 사들이고 파는 일을 두 달 했더니 10㎡ 남짓한 공간을 세를 얻을 수 있었다.
‘사고팔고 주문받는 서점’이라는 상호로 6년을 버텼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1991년 지금의 영록서점을 열었다.
마산자유무역 주변에 550㎡ 규모로 이전하면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책이 늘기 시작해 오늘날 120만 권에 이르렀다. 물론 그동안 옮기기도 했다.
박 대표의 옛 이야기에만 젖어 있기에는 영록서점 안에는 다른 이야깃거리가 넘쳤다.
박 대표가 손으로 어깨를 당기는 바람에 미로 같은 ‘책의 터널’로 동행했다.
‘헌책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글에 박 대표의 얼굴 사진이 담긴 대형 걸개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2007~2008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생학습 축제 때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까지 초·중등 교과서 400여 권을 전시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창원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헤드램프까지 장착한 그가 더 구석진 것으로 끌고 갔다.
1949년판 ‘과학공부 6-1’, 소화 3년(1928년) 동경 명문당장판이라고 글씨가 씌어진 ‘양잠법교과서’ 등이 들어온다.
“산수 5-2는 단기 4294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하자 “1961년”이라고 묻지도 않은 답을 한다.
현대문학, 사상계 등 해방 이후 국내에 발행된 귀한 책도 어둠 속에서 몸을 드러냈다. 한쪽에는 요즘은 보기 힘든 LP판이 빼곡하게 차 있다. 또 비디오테이프도 많다. 박씨가 모은 5만여 장의 LP판.
박씨가 모은 5만여 장의 LP판.
박 대표는 “LP판은 5만여 장 되고 비디오테이프는 1만여 개에 이른다”면서 “책 뒤에 붙은 각 출판사의 안내 표지도 모은다”고 말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여기 이름이 있는 작은 서점들이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면서 “일반인이 보기엔 하찮은 일이지만 고서학 등 학문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책 120만여 권에 대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서 함께 책 표지를 스캐닝하고 내용을 축약해 분류하고 있다”면서 “10년에 걸쳐 지금 17만5000권 정도를 끝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아마 10년 후쯤이면 절반인 50만권은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간혹 지금도 책 표지를 받아 보고 싶다고 하는 대학원생 등 학문을 하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자료를 챙겨 줄 땐 너무 기쁘고 내 존재감도 느낀다”고 씨익 웃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책 주문을 받아 주말에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폐교를 빌리거나 얻어 긴 복도에 연도별로 책을 전시해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서 “긴 학교 복도 양쪽에 책을 쌓아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며 답변을 더했다.
풀이 자라면 나무가 되고 나무가 크면 고목이 되어 그림자가 생긴다는 의미의 ‘영록’처럼 박 대표의 아름다운 상상이 현실이 돼 무뚝뚝한 그의 얼굴에 항상 웃음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헌책의 책갈피에 남기고 자리를 떴다.
글=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사진=전강용기자 j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6일 (금)
- 경남신문 > 사람속으로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 소녀랍니다”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 소녀랍니다” 와~ 이것도 창원서 만든다고?
와~ 이것도 창원서 만든다고? 창원 성산아트홀, 건립 23년 만에 싹 바꾼다
창원 성산아트홀, 건립 23년 만에 싹 바꾼다 수소트램·항공엔진·차세대원전 주요 기업 핵심 전략 공개
수소트램·항공엔진·차세대원전 주요 기업 핵심 전략 공개 [옥영숙의 내돈내산 시인의 한끼] (4) 의령 ‘꽃 피는 산골’과 ‘리치 커피’
[옥영숙의 내돈내산 시인의 한끼] (4) 의령 ‘꽃 피는 산골’과 ‘리치 커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2조2000억대 ‘천무’ 2차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2조2000억대 ‘천무’ 2차 계약 항공방산·정밀기계 선도기업, 창원에 2708억 투자
항공방산·정밀기계 선도기업, 창원에 2708억 투자 생태계 파괴 vs 시민 안전… 창원천 준설 놓고 ‘공방’
생태계 파괴 vs 시민 안전… 창원천 준설 놓고 ‘공방’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반대 않지만 도민 동의 전제돼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반대 않지만 도민 동의 전제돼야” 두산에너빌리티, 루마니아 SMR 수출 가능성 ‘성큼’
두산에너빌리티, 루마니아 SMR 수출 가능성 ‘성큼’

















